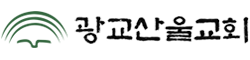[나의 회심 이야기_김민철_01] 어린시절 교통사고, 꿈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글쓴이 | 김민철

나는 한국전쟁 직후인 어느 성탄절 전야에 전형적인 농촌이었던 김제 평야에서 신앙의 가정에 태어났다. 내가 태어나자 곧 성탄절 새벽송이 우리 집 문 앞에서 울려 퍼졌다고 한다. 해마다 내 생일만 돌아오면 세상이 들뜬 분위기여서, 그 땐 내가 무엇(something)이라도 되는 줄 착각도 했었다. 그렇게 ‘무엇’인 줄 알고 시작된 나의 인생이었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는 누구나 경험하는 것처럼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nothing)는 생각 때문에 자존감의 상실 속에서 헤맸다. 특히나 고등학교 시절, 생물 선생님이 진화론을 진리로 가르치고는 “그래도 창조를 믿는 학생 있나?”라며 비아냥거릴 땐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허무해 보이기도 했다. 지난 58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마다 이런 모습을 보였던 nothing이면서도 something인 체하던 나를 하나님께서 동행해주시며 인도해주셨던 세월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당한 교통사고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는 도로가 잘 정비된 때가 아니었다. 내가 살던 시골의 좁은 길로 비료를 가득 실은 트럭이 나를 향해 오고 있었고 나는 비껴 설 공간이 없었다. 나는 마침 길 가의 도랑에 놓여있던 통나무 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차량의 진동으로 이 통나무가 흔들리는 바람에 나는 한 쪽 발을 도로 위에 내려짚고 말았다. 이 발을 트럭의 뒷바퀴가 짓이기고 지나간 것이다. 항생제를 비롯하여 약이 그리 풍부하지 못했던 60년 대 초반, 시골 의원에서나마 수술을 받을 수 있었던 것만도 감사할 일이었다. 그러나 봉합한 부위가 감염이 되면서 발등의 피부와 살이 모두 썩어 버렸다. 결국 내 허벅지에서 피부이식까지 받으며 석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지내야만 했었다.
그러나 불행했던 이 경험은 나를 의사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나는 척추결핵을 앓고 있던 내 또래의 아이를 알게 되었는데 이 병은 당시로서는 낫기 힘든 고질병이었다. 점심때가 되면 우리 어머니가 삶아 온 고구마로 점심을 때우는 보호자들이 여럿 있었다. 그 땐 그렇게 나누어 먹으며 살았다. 그 아이와 그 어머니도 단골이었다. 우리 어머니에게 들은 바로는 자식의 병 때문에 알량한 재산을 다 허비한 그 아이의 아버지는 돈을 벌어 오겠다고 집을 나간 후 아직 소식이 없다고 했다. 아이의 어머니는 삯바느질을 해서 돈을 모으긴 했지만 병원비는 물론 먹을 것마저도 부족한 처지였다.
그래도 점심시간은 즐거운 시간이었다. 주로 어머니들인 보호자들은 온갖 이야기꽃을 피우다가는 환자 아이들에게 노래를 시키곤 했다. 그 때마다 이 아이가 망설이지 않고 부르는 노래가 있었다. 당시에 유행하던 “오동추야 달이 밝아 오동동이야”하는 노래의 가사를 바꿔서 “깡통 줄게 밥 얻어 와라,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하루 이틀 굶었더니 눈깔이 삼십 리”하고 거지들이 동냥할 때 구성지게 부르던 노래였다. 나는 이 아이가 정말 가난하고 불쌍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들으면 이불을 뒤집어쓰고 눈물을 울었다. 슈바이처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감수성을 주셨다”고 했다는데 나에게도 해당되었던 것 같다.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마음에 자라나기 시작한 것은 불행한 일이 틀림없었던 교통사고를 통해서였다.
돌이켜 보면 어린 시절의 교통사고 이래로 내가 걸어온 길이 내 뜻대로 이뤄진 것만은 아니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루고 싶었던 something 대신 내 인생을 통해 어떻게 그 분의 something을 이루어 가시는 지를 발견하는 기쁨으로 채워주고 계신다. 그 덕분에 나는 수난과 은혜의 십자가 복음이 결코 천박한 풍요의 신학으로 전락하지 않아야한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